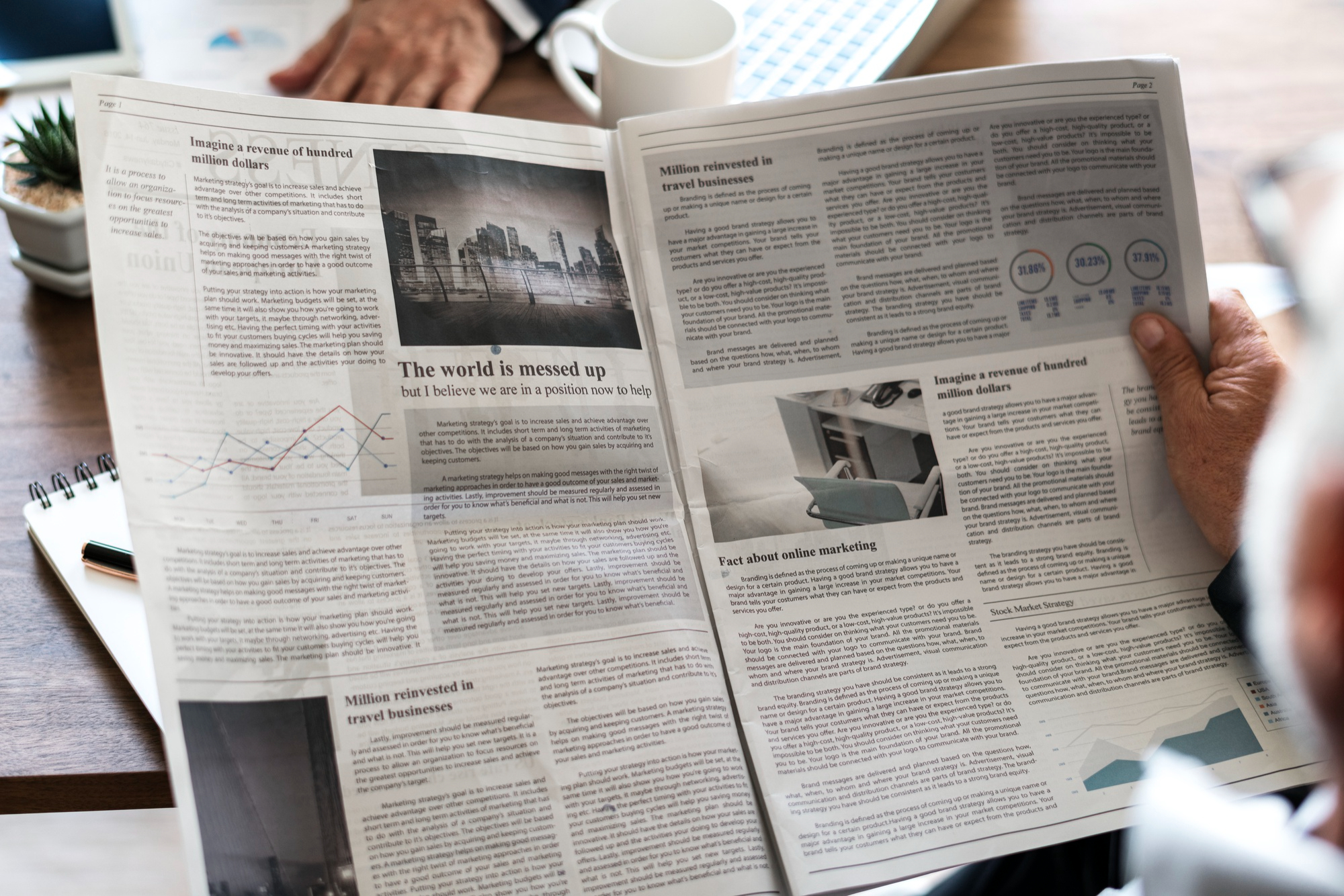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 형국이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날로 커지는 형국이지만, 함부로 손대기에는 간신히 살아난 부동산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단 ‘가계부채 질 개선’과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걸되 조심스럽게 대출 축소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여신심사 선진화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이번달 내로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의 주요 골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상환능력 중심 심사, 변동금리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 등이다.
DSR은 대출 신청자의 보유주택, 담보대출, 신용대출 이자만 반영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를 사전에 솎아낸다.
따라서 대출 문턱이 과거보다 한층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 담보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 은행권의 여신 심사를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빙 소득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평가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담보가 있어도 소득이 부족할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신규 주택담보대출, 고(高)부담대출,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은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거치식 혹은 변동금리대출을 받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까지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을 심사할 때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는 계산법이다.
내년에 시중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변동금리대출자의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 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며 “향후 금리 인상에 대비한 대출자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간접적 가계부채 총량 억제
금융위원회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질 개선’, ‘합리적인 여신심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내밀었다. 그러나 속에 숨은 뜻은 “가계부채 총량 억제”라는 것이 세간의 시선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도 “가계부채 질 개선 정책의 목적 중 하나는 가계부채 축소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그만큼 현재의 가계부채 팽창 속도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은 총 1166조374억원으로 2분기말(1131조5355억원) 대비 34조5019억원(3.0%) 늘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자 분기별 최대 증가폭이다. 2분기(33조2000억원)의 최대 증가폭 기록을 한 분기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가계부채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단숨에 1%포인트 이상 올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 이 경우 한국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지금 낮은 이자율 덕에 간신히 버티는 채무자들이 많다”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당액의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가계부채 억제책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이 차마 직접적 수단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나 DTI 규제 강화에 손을 못 대는 것은 부동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미 내년 부동산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며 “여기에 규제까지 강화되면, 폭삭 주저앉을 수 있다”고 염려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사이에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